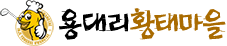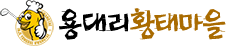[2017.02.04] [여행] 매서운 북서풍에 포슬포슬 황태가 익어간다 - 세계일보
페이지 정보

본문
강원 인제 '황태덕장'
날이 별로 춥지 않아 검게 되면 '먹태' 날이 추워 하얗게 되면 '백태'
몸통이 잘린 것은 '파태' 머리가 없어진 것은 '무두태'
딱딱하게 마른 것은 '깡태' 실수로 내장이 제거되지 않고 건조된 것은 '통태'
건조 중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낙태'
다양한 별칭만큼 사랑받는 국민먹거리이다
흔하디흔한 생선이다 보니 이름만 수십개다. 그중 몇 개만 익숙하고,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 더 많다.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명태. 하지만 국민 생선이라 불리기 민망할 정도로 국산 명태는 거의 씨가 말랐다. 지금 우리가 먹는 명태 대부분은 러시아 해역에서 잡아 국내에 들여온 것이다. 바다에 사는 명태에 국적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구분을 하는 때이니 알고는 먹어야 한다.
이 명태가 겨울이 되면 지천에 널리는 곳이 있다. 겨울철 북서계절풍이 불어와 매서운 추위가 닥치는 태백산맥 서쪽 사면의 강원 인제다. 외국에서 온 명태는 인제에서 외국물을 제대로 뺀다. 한국의 한겨울 칼바람을 맞은 명태는 20번 이상 얼고 녹기를 반복한다. 백야의 영해에서 잡힌 명태는 이 과정을 거치면 살이 부드러워지고 누런 빛을 띠게 된다. 명태가 황태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애초 황태는 북부지방인 함경도 지방의 특산물이었다. 6·25전쟁으로 함경도 청진, 원산 등에서 황태덕장을 하던 피란민들이 휴전선 인근 강원도에 터를 잡았다. 함경도 지방과 날씨가 흡사한 인제 용대리 지역에 덕장을 설치하면서 황태덕장 단지가 형성됐다. 용대 1∼3리에 분포돼 있는데 미시령 아래인 용대3리에 몰려 있다. 전국 황태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곳이 용대리다.
보통 12월 중순부터 황태를 걸기 시작하는데, 20여개의 크고 작은 황태덕장이 용대리 일대에 선다. 지금 용대리에 들어서면 곳곳에 황태덕장이 세워져 있다. 덕장에 걸려 있는 명태 수천마리의 모습은 한겨울이 왔다는 증표다. 황태덕장 주인의 말을 빌리면 명태가 황태가 되려면 ‘콧속이 쩍쩍 달라붙도록 추워야 가능하다’고 한다.
올해는 황태덕장이 1월 중순에 섰다. 12월 말까지 날이 따뜻해 작업을 못하다가 1월 중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뒤늦게 시작되자 급하게 명태를 덕에 거는 상덕 작업을 했다. 날이 춥지 않을 때 상덕 작업을 하면 황태 상품의 질이 현격히 떨어진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야지만 제 맛을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계속 추운 날씨만 계속되면 황태가 될 수 없다. 얼고 녹고를 반복해야 한다. 삼한사온의 날씨가 반복되면 최상 품질의 황태가 태어난다. 사람이 날씨를 어쩌지 못한다. 하늘이 도와야 좋은 황태가 나올 수 있는 셈이다.
지금 시기 용대리 덕장에 걸린 것은 명태다. 3∼4월까지 건조를 마쳐야 황태가 된다. 용대리에서 먹는 황태는 지난해 봄 생산한 황태다. 그렇다고 맛이 떨어질 리는 없다. 어느 식당에 들어가도 좋다. 뜨끈한 국물을 들이켠다. 시원하게 목을 넘어간다. 묘하게 뜨거운데 시원하다. 노랗게 변한 두툼한 살을 씹는 맛이 쫄깃쫄깃하다. 바싹 마른 북엇국과는 다르다. 해장국뿐이랴. 간장과 마요네즈를 섞은 후 청양고추를 잘게 썰어 넣은 소스에 찍어먹는 황태채는 술안주로 일품이다.
요즘엔 먹태란 것이 황태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 날이 별로 춥지 않아 검게 된 것을 먹태라 한다. 실패작이지만 맛은 나쁘지 않다. 반면 날이 추워 하얗게 된 것은 백태라고 한다. 건조과정에서 몸통이 잘린 것은 파태, 머리가 없어진 것은 무두태로 부른다. 이 외에도 딱딱하게 마른 깡태, 작업중 실수로 내장이 제거되지 않고 건조된 것을 통태, 건조 중 바람에 의해 덕대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낙태라고 한다. 별칭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것일 테다.
뜨끈한 황태해장국을 한 그릇 한 뒤엔 해방 후 서울 명동의 낭만을 느껴보자. 산골 인제에서 서울 명동의 낭만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모더니즘 시인 박인환 덕분이다. 1926년 8월 인제에서 태어난 박인환은 11세에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이주했다.
박인환문학관 앞마당엔 넥타이가 바람에 날리며, 만년필을 쥐고 시상을 떠올리고 있는 시인 동상이 서 있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는 시인의 대표작 ‘목마와 숙녀’에서 연상되는 멋스러운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모습이다.
문학관을 들어서면 박인환 시인이 활동했던 해방 전후의 종로와 명동거리가 펼쳐진다. 가장 먼저 나오는 ‘마리서사’는 박인환이 스무 살 무렵 종로 낙원동에 세운 서점이다. 프랑스 출신 화가이자 시인인 마리 로랑생과 책방을 뜻하는 서사(書舍)를 합친 것이다. 문인들의 사랑방으로 한국 모더니즘 시운동이 일어난 발상지였다.
마리서사 옆에는 김수영 시인의 모친이 충무로에 낸 빈대떡집 ‘유명옥’이, 유명옥 맞은편엔 ‘봉선화 다방’이 자리 잡고 있다. 고전음악을 듣는 곳으로 8·15해방 후 명동에서 가장 먼저 개업했다. 문인과 예술가들은 이곳에서 시낭송의 밤, 출판기념회, 전시회 등을 열었다. 그밖에 ‘모나리자 다방’, ‘동방싸롱’, ‘포엠’ 등 박인환이 거쳐간 가게들을 재현해 놓았다.
2층엔 탤런트 최불암 모친이 운영한 막걸리집 ‘은성’이, 그 옆에 당시 박인환 시인의 사진들이 걸려 있다. 박인환 시인의 작품보단 당시의 낭만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돼 둘러보는 재미가 있다. 박인환문학관 왼쪽에는 인제산촌민속박물관이 있다. 1960년대 산촌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모형과 실물, 영상 등으로 꾸며 놓아놓아 지금은 알기 힘든 산촌 문화를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다.
인제=글·사진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날이 별로 춥지 않아 검게 되면 '먹태' 날이 추워 하얗게 되면 '백태'
몸통이 잘린 것은 '파태' 머리가 없어진 것은 '무두태'
딱딱하게 마른 것은 '깡태' 실수로 내장이 제거되지 않고 건조된 것은 '통태'
건조 중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낙태'
다양한 별칭만큼 사랑받는 국민먹거리이다
흔하디흔한 생선이다 보니 이름만 수십개다. 그중 몇 개만 익숙하고,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 더 많다.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명태. 하지만 국민 생선이라 불리기 민망할 정도로 국산 명태는 거의 씨가 말랐다. 지금 우리가 먹는 명태 대부분은 러시아 해역에서 잡아 국내에 들여온 것이다. 바다에 사는 명태에 국적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구분을 하는 때이니 알고는 먹어야 한다.
이 명태가 겨울이 되면 지천에 널리는 곳이 있다. 겨울철 북서계절풍이 불어와 매서운 추위가 닥치는 태백산맥 서쪽 사면의 강원 인제다. 외국에서 온 명태는 인제에서 외국물을 제대로 뺀다. 한국의 한겨울 칼바람을 맞은 명태는 20번 이상 얼고 녹기를 반복한다. 백야의 영해에서 잡힌 명태는 이 과정을 거치면 살이 부드러워지고 누런 빛을 띠게 된다. 명태가 황태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애초 황태는 북부지방인 함경도 지방의 특산물이었다. 6·25전쟁으로 함경도 청진, 원산 등에서 황태덕장을 하던 피란민들이 휴전선 인근 강원도에 터를 잡았다. 함경도 지방과 날씨가 흡사한 인제 용대리 지역에 덕장을 설치하면서 황태덕장 단지가 형성됐다. 용대 1∼3리에 분포돼 있는데 미시령 아래인 용대3리에 몰려 있다. 전국 황태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곳이 용대리다.
보통 12월 중순부터 황태를 걸기 시작하는데, 20여개의 크고 작은 황태덕장이 용대리 일대에 선다. 지금 용대리에 들어서면 곳곳에 황태덕장이 세워져 있다. 덕장에 걸려 있는 명태 수천마리의 모습은 한겨울이 왔다는 증표다. 황태덕장 주인의 말을 빌리면 명태가 황태가 되려면 ‘콧속이 쩍쩍 달라붙도록 추워야 가능하다’고 한다.
올해는 황태덕장이 1월 중순에 섰다. 12월 말까지 날이 따뜻해 작업을 못하다가 1월 중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뒤늦게 시작되자 급하게 명태를 덕에 거는 상덕 작업을 했다. 날이 춥지 않을 때 상덕 작업을 하면 황태 상품의 질이 현격히 떨어진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야지만 제 맛을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계속 추운 날씨만 계속되면 황태가 될 수 없다. 얼고 녹고를 반복해야 한다. 삼한사온의 날씨가 반복되면 최상 품질의 황태가 태어난다. 사람이 날씨를 어쩌지 못한다. 하늘이 도와야 좋은 황태가 나올 수 있는 셈이다.
지금 시기 용대리 덕장에 걸린 것은 명태다. 3∼4월까지 건조를 마쳐야 황태가 된다. 용대리에서 먹는 황태는 지난해 봄 생산한 황태다. 그렇다고 맛이 떨어질 리는 없다. 어느 식당에 들어가도 좋다. 뜨끈한 국물을 들이켠다. 시원하게 목을 넘어간다. 묘하게 뜨거운데 시원하다. 노랗게 변한 두툼한 살을 씹는 맛이 쫄깃쫄깃하다. 바싹 마른 북엇국과는 다르다. 해장국뿐이랴. 간장과 마요네즈를 섞은 후 청양고추를 잘게 썰어 넣은 소스에 찍어먹는 황태채는 술안주로 일품이다.
요즘엔 먹태란 것이 황태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 날이 별로 춥지 않아 검게 된 것을 먹태라 한다. 실패작이지만 맛은 나쁘지 않다. 반면 날이 추워 하얗게 된 것은 백태라고 한다. 건조과정에서 몸통이 잘린 것은 파태, 머리가 없어진 것은 무두태로 부른다. 이 외에도 딱딱하게 마른 깡태, 작업중 실수로 내장이 제거되지 않고 건조된 것을 통태, 건조 중 바람에 의해 덕대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낙태라고 한다. 별칭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것일 테다.
뜨끈한 황태해장국을 한 그릇 한 뒤엔 해방 후 서울 명동의 낭만을 느껴보자. 산골 인제에서 서울 명동의 낭만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모더니즘 시인 박인환 덕분이다. 1926년 8월 인제에서 태어난 박인환은 11세에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이주했다.
박인환문학관 앞마당엔 넥타이가 바람에 날리며, 만년필을 쥐고 시상을 떠올리고 있는 시인 동상이 서 있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는 시인의 대표작 ‘목마와 숙녀’에서 연상되는 멋스러운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모습이다.
문학관을 들어서면 박인환 시인이 활동했던 해방 전후의 종로와 명동거리가 펼쳐진다. 가장 먼저 나오는 ‘마리서사’는 박인환이 스무 살 무렵 종로 낙원동에 세운 서점이다. 프랑스 출신 화가이자 시인인 마리 로랑생과 책방을 뜻하는 서사(書舍)를 합친 것이다. 문인들의 사랑방으로 한국 모더니즘 시운동이 일어난 발상지였다.
마리서사 옆에는 김수영 시인의 모친이 충무로에 낸 빈대떡집 ‘유명옥’이, 유명옥 맞은편엔 ‘봉선화 다방’이 자리 잡고 있다. 고전음악을 듣는 곳으로 8·15해방 후 명동에서 가장 먼저 개업했다. 문인과 예술가들은 이곳에서 시낭송의 밤, 출판기념회, 전시회 등을 열었다. 그밖에 ‘모나리자 다방’, ‘동방싸롱’, ‘포엠’ 등 박인환이 거쳐간 가게들을 재현해 놓았다.
2층엔 탤런트 최불암 모친이 운영한 막걸리집 ‘은성’이, 그 옆에 당시 박인환 시인의 사진들이 걸려 있다. 박인환 시인의 작품보단 당시의 낭만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돼 둘러보는 재미가 있다. 박인환문학관 왼쪽에는 인제산촌민속박물관이 있다. 1960년대 산촌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모형과 실물, 영상 등으로 꾸며 놓아놓아 지금은 알기 힘든 산촌 문화를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다.
인제=글·사진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글[2017.03.22] 인제 용대리 매바위에 ‘짚라인’ 설치 - 프레시안 24.07.22
- 다음글[2016.05.08] 인제 황태축제 성황리 폐막 - NEWSIS 24.07.22